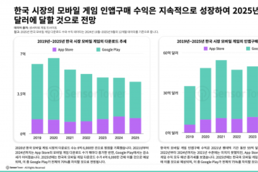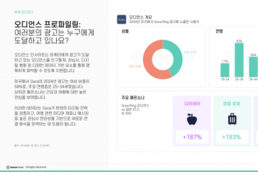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시범 운영을 담은 결의안 05/2025/NQ-CP를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하면서,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잇따라 베트남 내 서비스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반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건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최대 5년간 시행되는 시범 제도로, 토큰화 자산은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보완의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블록체인협회(VBA) 판득쭝(Phan Duc Trung) 회장은 “토큰화 실물자산(RWA)의 국내 투자 매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처럼 초기에는 제한을 두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점차 국내 투자자에게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세계 각국이 취해온 일반적인 절차”라며 “섣부른 전면 개방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제 시장에서는 ▲2022년 테라·루나 붕괴로 약 600억 달러 손실,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Mt. Gox) 해킹(4억8천만 달러 피해), ▲2018년 코인체크(Coincheck) 해킹(5억 달러 이상 피해) 등 대형 참사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 시행 직후, 카이버스왑(KyberSwap), 코인98 월렛(Coin98 Wallet, Ninety Eight), 로닌 월렛(Ronin Wallet, Sky Mavis) 등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들이 빠르게 베트남 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들 기업은 “새 규제 준수”를 이유로 들었으나, VBA는 이를 “감정적인 대응”으로 평가했다.
판 회장은 “이들 기업 다수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로,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고위험 부문”이라며 “잠정적 차단은 이해되지만, 협회가 지난 2년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음에도 이들 기업은 공식적인 피드백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처럼 업계가 적극적으로 정부 협의에 참여해 규제 틀을 함께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판 회장은 “지금은 시범 단계일 뿐이며, 업계가 성급하게 퇴출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베트남 내 투자자에게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열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